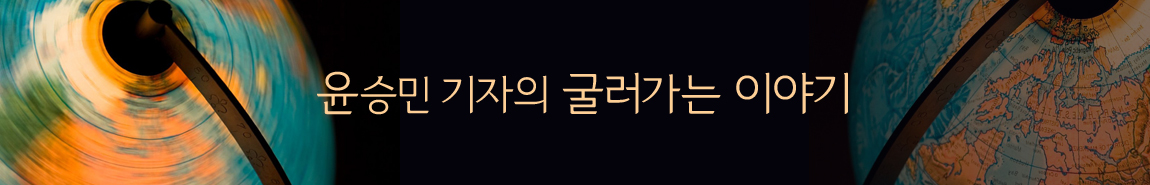하종현(90)하면, ‘접합’이고, 배압법(背押法)이다. 성긴 마대(麻袋)로 된 캔버스 뒷면에서 물감을 칠한 뒤 이를 주걱 등으로 밀어 넣으면, 마대의 틈으로 물감이 앞면까지 튀어나온다. 이 배압법을 다양하게 변주한 ‘접합’ 연작이 하종현에게 ‘단색화의 거장’이라는 칭호를 선사했다.
하종현이 ‘접합’을 그리기 전과 후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아트선재센터에서는 지난 2월14일부터 하종현의 접합 이전 작품과 접합 초기작을 ‘하종현 5975’로, 국제갤러리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접합 최근작들을 ‘Ha Chong-Hyun’으로 각각 선보이고 있다.

아트선재센터의 ‘하종현 5975’는 4부로 구성돼 있는데, 각 부가 각기 다른 전시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적이다. 하종현이 1959년 졸업한 홍익대 시절부터 끊임없이 실험하는 작가였다는 증거다. 그는 1960년대 초에는 한국전쟁 후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듯 그림에 불까지 그을려가며 어두운색을 주로 사용했다. 질감을 강조하는 그의 작품답게 그림에 실을 붙여 입체감을 주기도 했다. 하종현은 1960년대 후반 한국의 발전이 시작되자 한국의 전통 단청 문양과 오방색을 이용하고, 캔버스를 길게 잘라 직조하거나 구부리는 기법도 썼다.
1969년 한국아방가르드협회를 결성해 회장에 오른 뒤엔 작품에 입체감이 더 강조된다. 캔버스에는 스프링이나 와이어가 붙는다. 거울을 세우고 신문지를 쌓기도 한다. ‘입체를 평면에 어떻게 옮길지’를 연구한 결과는 1974년 시작한 접합 연작으로 귀결된다. 마대로 만든 캔버스에 삐져나오거나, 눌리거나, 흐르는 흰 물감은 하종현 작품 세계의 새 막을 연다.

국제갤러리의 ‘Ha Chong-Hyun’에서는 접합 최신작을 만날 수 있다. 국제갤러리는 하종현 개인전을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하종현의 2023~2024년 작품들을 다수 포함했다. 마대와 흰 물감에서 시작했던 접합 연작에는 시간이 지나며 빨간색, 파란색 등 다양한 원색이 등장한다. 캔버스 뒤에서 튀어나온 물감을 주걱 등 다양한 기구로 긁거나 더하면서 다양한 효과를 냈다.
2024년 작인 ‘접합 24-52’는 초기작처럼 마대에 흰 물감을 밀어냈지만, 아래쪽에 더 많은 물감을 배치해 맨 아래는 물감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대로 남았다. 2023년 작 ‘접합 23-93’은 검은 배경에 위쪽에는 흰색과 밝은색, 아래쪽에는 진한 파란색을 더해 그라데이션 효과를 냈다.

하종현이 2009년부터 시작한 ‘이후(Post) 접합’ 작품들도 있다. 나무 화판을 조각으로 자른 뒤 캔버스 천으로 감싸고, 이를 다시 배열한 뒤 화판 틈마다 물감을 짜 넣고 누르는 방식으로 작업한 것들이다. 접합과 ‘이후 접합’ 모두,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물감이 흘러나간다는 특성이 있다. 물감이 흘러내리거나, 두껍게 덧칠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눈으로 질감을 느낄 수 있다. 재료의 성질에 관심을 기울이고 표현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던 하종현의 실험 정신이 드러난다.
아트선재센터의 ‘하종현 5975’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며 관람료는 성인(25~64세) 1만원이다. 국제갤러리의 ‘Ha Chong-Hyun’은 다음달 11일까지.
'문화는 이렇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월7일]윤석열 파면 후 종교계 연일 “통합”…정순택 “적대감·증오 경계” (1) | 2025.04.12 |
|---|---|
| [4월6일]오디아르·다르덴 형제…해외 거장들의 옛 작품, 잇달아 재개봉 (0) | 2025.04.12 |
| [4월3일][책과 삶] ‘논리의 감옥’ 벗어나 자연을 본다면 (0) | 2025.04.06 |
| [4월3일]크리스티 아시아·태평양 사장 “아시아 미술 수집가 참여 눈에 띈다” (0) | 2025.04.06 |
| [4월1일]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와 가까운 고궁·박물관 휴관 (0) | 202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