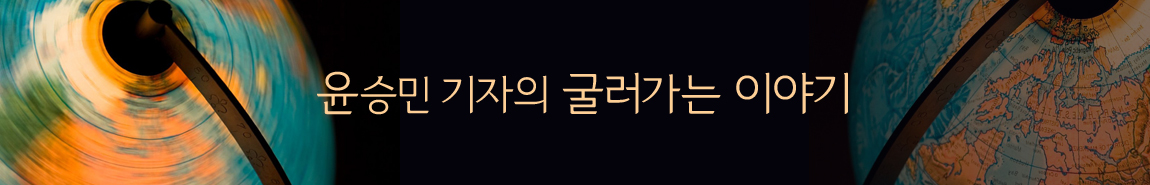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경제·문화적으로도 주목받는 나라가 되기까지. 한국이 한 세기 만에 놀라운 성취 뒤엔 단기간에 겪은 급진적인 변화가 있다. 미술계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전쟁 전후 전쟁의 참상을 그린 작품, 현대미술가협회 창설과 앵포르멜(비정형 미술) 운동의 시작은 모두 1950년대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큰 흐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던 작가 집단이 있었다. 1957~1960년 활동한 ‘모던아트협회’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열리고 있는 ‘조우, 모던아트협회 1957~1960’는 모던아트협회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 156점을 전시하며 모던아트협회를 재조명하고 있다. 박고석, 유영국, 이규상, 한묵, 황염수가 중심이 돼 결성한 모던아트협회는 4년간 6차례 전시를 열었다. 당시 전시에는 문신, 천경자 등 당대의 유명 작가 총 11명이 참여했다.
모던아트협회는 왜 결성됐을까. 한국전쟁 후 삶과 예술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이유다. 협회 참여 작가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을 하며 추상화를 배웠지만, 협회 설립 전부터 전쟁의 참상을 화폭에 표현해냈다. 전쟁통의 작가들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일본어 ‘하꼬방’으로 통하던 판잣집을 화실로 개조했고 그 주변 풍경을 그렸다. 박고석이 1951년 부산 범일동 철길 주변을 그린 ‘범일동 풍경’이 대표적이다. 한묵은 ‘모자’(1954)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채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를 나타냈다. 엄마의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큰 아이가 서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다. 이목구비도 생략된 모자는 전쟁의 참상과 쓸쓸함을 느끼게 하지만, 역경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강인함도 생각하게 된다.


모던아트협회가 결성된 후 전시를 개최하는 동안의 작품들끼리는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협회가 특정한 양식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직 미술계의 학연과 지연을 갈라 파벌을 칭하기도 이르던 시절, 대구의 정점식과 마산의 문신, 평양의 박고석과 황염수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작가들은 대체로 추상화를 그렸지만, 이규상은 ‘작품A’(1959)에서 보듯 십자가와 예수의 형상을 은유하는 듯한 표현으로 종교적 색채를 띠었다. 박고석은 폴 세잔의 정물화를 연상케 하는 ‘가지가 있는 정물’(1955)처럼 인상주의적 관찰을 포함한 추상화를 그렸다. 문신은 ‘소’(1957)에서 소의 몸통에 뼈를 함께 그려 넣으며 입체주의적 표현을 차용했다. 평양의 비단 염색공장 아들이던 황염수는 구상 회화를 그리며 강렬한 색채 대비를 주로 사용했다. 1959년 협회의 5회 전시 출품작인 황염수의 ‘나무’(1950년대)는 현재 전해지는 그의 작품 중 거의 유일하게 연대가 알려진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전시의 끝에 다다르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 모던아트협회는 왜 3년 만에 해산됐을까. 앞서 언급한 자유로움과도 관계가 있다. 1960년대에 이르자 작가들은 각자의 길에 들어선다. 문신과 한묵은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고, 임완규는 홍익대, 정점식은 계명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김경과 이규상, 정규는 1960~1970년대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협회 결성 전과 결성 기간에 주목했던 전시는 협회 해산 후 작가들이 떠난 각자의 길 초입까지 안내한다. 이건희컬렉션에 속하는 유영국의 ‘새벽’(1966)과 한묵의 ‘무제’(1965) 등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이효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학예연구사는 “모던아트협회를 상징하는 것은 ‘존중’과 ‘자율성’”이라며 “당시 국제적인 미술사조였던 모더니즘을 보여주면서도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잃지 않고, 고민하던 것을 실천해냈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황염수가 1970년대 이후 그린 장미 연작과 팬지, 해바라기 등 꽃을 그린 22점이 미술관 내 보이는 수장고에서 한 자리에 함께 설치돼 있어 오밀조밀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시는 내년 3월8일까지. 입장료는 2000원.
청주 |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문화는 이렇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1월6일][책과 삶]지역의 삶 듣고 기록하고 지키는 보루 (1) | 2025.11.07 |
|---|---|
| [11월5일]국립경주박물관, 한·미, 한·중 정상회담장 공개 (0) | 2025.11.07 |
| [11월5일]5~6세기 가야 말 갑옷은 신라의 화살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0) | 2025.11.07 |
| [11월4일]전시도 안 되던 깨진 유물이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난 순간 (0) | 2025.11.05 |
| [11월4일]나주 복암리 고려 관청 건물터에서 축대·배수로 구조도 발견 (0) |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