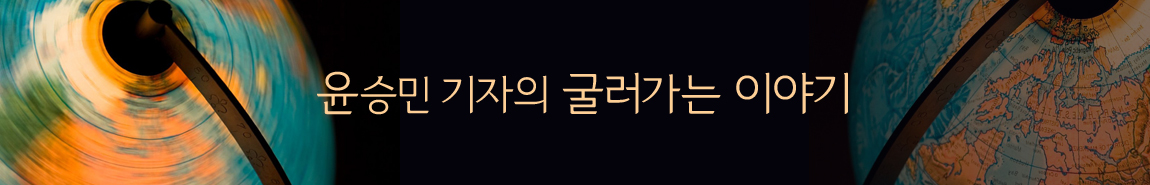줄기는 꼿꼿해도,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그 잎을 흔든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은 그 소리만으로도 듣는 이들을 시원케 한다. 세종대왕의 고손자이자 왕실의 화가였던 탄은 이정(1554~1626)이 그린 ‘풍죽’(17세기)은 바람 불 때 잎이 날리는 대나무의 모습을 그려낸 대표작이다. 풍죽은 5만원권 지폐 뒷면에 그려진 그림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구 수성구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지난 23일 개막한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삼청도도 - 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에서는 풍죽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별도 전시 공간간에 들어가면 정면에 ‘풍죽’이 보이고 양쪽 벽면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 영상이 소리와 함께 펼쳐진다. 영상이 거울에 반사되면서 이정의 풍죽은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지면과 평행하게 뻗은 먹빛 대나무 잎이 바람을 타고 뻗은 것만 같다. 묵죽화(墨竹畵)의 대가였던 이정의 뛰어난 표현력 덕도 크다.

전시는 이정이 먹빛 비단에 금으로 대나무와 매화, 난초를 그린 화첩 <삼청첩>에서 출발한다. 이정은 임진왜란 중 왜적의 칼을 맞고 오른팔을 다친 뒤 회복한 1594년,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고 조선의 사기를 북돋우겠다는 생각으로 <삼청첩>을 완성한다. 당대 최고 문인이던 최립의 글과 명필 석봉 한호의 글씨도 함께 쓰였고, 17세기에는 빈 곳에 후대 문인 송시열 등의 글이 더해졌다. 2018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그림이 20면, 글이 29면이 포함된 <삼청첩> 전체 56면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용 대구간송미술관 학예총괄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한가로운 취미로 비칠 수 있지만, 왕실 화가가 전쟁이라는 시대적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삼청첩>은 기구한 역사를 맞이했다. 병자호란 때는 일부가 불에 탔으며, 외세가 침략했던 19세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935년 간송 전형필이 수집했다. 글씨가 쓰인 먹 비단 일부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으며, 송시열이 쓴 ‘삼청첩발’(1680)의 행간에는 임오군란 때 인천에 들어온 일본 군함 일진함(日進艦)의 함장 쓰보이 고조(坪井航三)가 ‘<삼청첩>을 손에 넣었다’고 일본어로 쓴 글씨도 남아 있다.

특별한 역사성 때문에 광복 80주년 전시의 주인공이 됐지만, <삼청첩>은 예술성 또한 높이 평가받는다. 금가루를 아교와 섞어 비단에 그린 그림은 종이에 먹으로 그릴 때보다 정교함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수집 후 복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정은 대나무의 탄생부터 말년까지의 성장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금이 섞인 아교를 흩뿌리는 기법으로 달과 매화도 그려낸다.
<삼청첩> 외에 종이에 묵으로 그려낸 이정의 대나무도 예사롭지 않다. ‘풍죽’ 외에도 이정은 묵의 농도를 달리하여 가깝고 먼 대나무를 한 폭에 그려낸다. 먼 곳에 있을 대나무를 보일 듯 말듯 연하게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현존하는 이정의 유일한 인물화 ‘문월도’(16~17세기)도 볼 수 있다.

당대의 문인들과 미술사 전공자에게는 잘 알려진 이정이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는 그가 천착했던 대나무가 매화나 국화 같은 다른 사군자보다는 화려함과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이정의 대나무에서 시작해 조선과 일제 강점기 문인들의 대나무로 완성된다. 17세기 조선의 명재상이던 한음 이덕형, 병자호란 때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삼학사 중 한 명인 추담 오달제, 항일의병장 유인석의 제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일주 김진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우당 이회영 등의 대나무와 매화를 볼 수 있다.
특히 김진우의 ‘허심수덕’(1932)은 지름 약 1.8m의 원형이라 눈길을 끄는데, 농도에 차이를 두면서도 쭉 뻗은 선으로 강인함을 나타낸 대나무 줄기는 독립운동 도중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그림을 놓지 않았던 그의 기개를 가늠하게 한다. <삼청첩>이 아픈 역사의 흔적을 품에 안은 채 외침(外侵)을 견뎠듯,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절개를 지켰던 이들의 그림과 글을 보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전시는 오는 12월21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1만1000원.
- 대구 |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문화는 이렇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월1일]검은색은 원래 하늘색이었다…유물로 다시 보는 검은색 (0) | 2025.10.02 |
|---|---|
| [9월29일]낙동강 마지막 주막 ‘삼강나루 주막’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0) | 2025.09.30 |
| [9월25일][책과 삶]멸종 예정된 존재, 인류…유일한 가능성은 ‘우주’ (0) | 2025.09.27 |
| [9월25일]고종이 선교사에게 하사한 ‘나전산수무늬삼층장’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0) | 2025.09.27 |
| [9월24일]박서보가 쓴 원고, 첫 자서전으로 전 세계 동시 출간 (0) | 2025.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