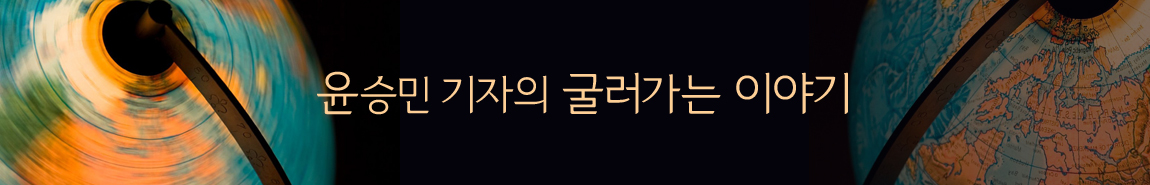한글 서예 외길 30여년. 한문이 주류인 서예계에서 평보 서희환(1934~1995)의 행보는 고집스러웠지만 그 결과물은 풍성했다. 초창기 대통령상을 안긴 글씨에 머물지 않고 글과 그림을 멈추지 않아 다양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리는 ‘평보 서희환: 보통의 걸음’ 전은 올해 서거 30년을 맞은 서예가 서희환의 작품을 총망라한 회고전이다. 올해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시 제목인 ‘보통의 걸음’은 그의 호 평보(平步)를 한글로 풀어 쓴 것이다. 서희환의 개인전은 생전 12번 열렸으나, 1991년 광주 남봉미술관에서의 전시를 끝으로 사후에는 열린 바 없다. 서희환의 작품 중 100여점 이상을 한데 모을 정도의 큰 전시도 없었다고 한다.
서희환의 대표적인 이력은 1968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받은 대통령상이다. 34세였던 서희환은 한글 서예 ‘애국시’를 출품했고, 회화나 조각·공예가 아닌 서예 부문으로는 처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시는 그 이력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전시를 기획한 김학명 예술의전당 학예사는 “대통령상을 받은 후 서희환 선생은 수년간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며 “서양화나 조각, 공예를 제치고 근본 없는 한글 서예에 대통령상을 줄 수 있느냐는 말부터, 스승의 글씨와도 너무 똑같다는 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희환의 스승은 소전 손재형(1903~1981)이었다. 수집가이자 서예의 대가로 일제의 ‘서도’와 구분되는 ‘서예’라는 말을 만든 손재형은 서희환의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는 묵묵함’을 높이 사 평보라는 호를 안겼다. 전시장에는 서희환이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을 즈음에 썼던 ‘조국강산’(1969) 근처에 손재형이 안중근의사 상 비문에 쓴 글씨가 놓였다. ‘ㅔ’자를 수직 방향으로 내려쓰다 허리쯤에서 7시 방향으로 꺾은 붓질이 두 사람의 작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서희환 작품의 가치는 평생 자신만의 글씨를 찾기 위해 했던 다양한 노력에 있다. 김 학예사는 “본인이 대통령상 수상 이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서희환이 1981년과 1989년, 1994년에 각각 쓴 ‘용비어천가 제2장’에서 변화를 향한 실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1989년 작이 전형적인 판본체라면 1981년 작은 판본체의 구도 안에서 변형을 준 글씨로, 1994년 작은 필기체에 가까운 글씨로 각각 쓰였다. 다양한 변주는 후대에 서희환이 판본체를 바탕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은 ‘평보체’를 구축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기반이 됐다.

종이 한가운데에 주제가 되는 큰 글씨를 써 놓거나 그림을 그리는, 당시 기준 파격적인 시도를 한 작품들도 보인다. 검은 먹으로 문인화를 그렸던 조선의 선비들처럼 서희환이 글씨와 곁들여 그렸던 그림들도 있다. 다만 정갈하고도 사실과 가까운 옛 문인화와는 달리 붓놀림이 거칠고 자유롭다. 이런 시도는 동양 예술의 오랜 화두였던 ‘서화동원’(書畵同原·글과 그림의 근원은 같다)과도 맥이 닿아 있다. 서희환이 한자로 남겼던 작품 중에도 ‘서화동원’(1990)이 있다.
전시의 백미는 높이 1.8m, 좌우 폭이 5.5m에 달하는 ‘월인천강지곡’(1980)이다. 세종이 1447년 지은 국문시가인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 창제 후 가장 빨리 만들어 한글로만 인쇄한 것이다. 서희환은 그 내용을 “자형에 충실하고 필의를 살리고 문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생명력있는 서가 되게 힘을 기울여” 일일이 썼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글자는 약 1만자에 달한다. 서희환이 교편을 잡았던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의 현판 글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현판 등 실생활과도 밀접했던 그의 활동도 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1만원.
'문화는 이렇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7월21일]불에 탄 고운사 연수전·가운루 보물 해제 논의 검토한다 (2) | 2025.07.25 |
|---|---|
| [7월17일][책과 삶] 속내 알 수 없는 AI에 대응하려면 (0) | 2025.07.19 |
| [7월13일]조계종 “남북 함께 세계유산 지정 환영…남북관계 개선 기다리겠다” (1) | 2025.07.19 |
| [7월13일]‘공룡 연구’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고생물학자로는 첫 청장 (1) | 2025.07.19 |
| [7월10일][책과 삶] “헌법 보호가 곧 정의”라는 오류 (0) | 2025.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