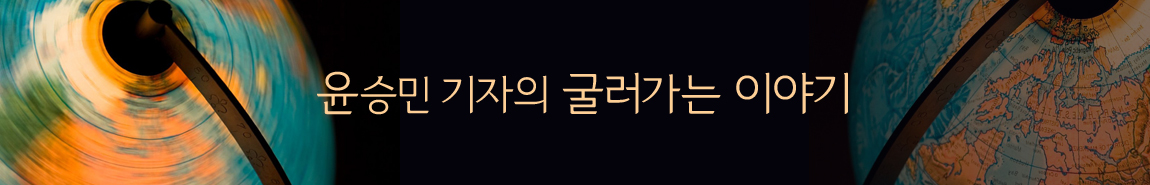강명희는 방랑 화가다.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났으나 1972년 프랑스로 이주해 그림을 그려왔다. 1986년에는 남편인 화가 임세택과 함께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2인전을 열었다. 몽골 고비사막, 칠레 파타고니아, 남극과 인도, 홍콩, 중국, 대만 등을 여행했고, 프랑스와 제주의 작업실을 오가며 그림을 그렸다.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지난 4일부터 열린 그의 개인전 ‘강명희-방문’은 작가의 삶을 한 단어로 집약해냈다. 작가가 60여년간 국내외를 오가며 그린 그림 총 125점을 세 공간으로 나누어 전시했다.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떠돌며 작업한 작가의 태도, 잠깐의 만남과 경험에서 얻는 예술적 영감을 전시에 담았다고 한다. 최근작부터 초기작으로, 시간 역순으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게 된다.
작품의 주된 주제는 자연이다. 1990년대 프랑스 북서부 투렌의 작업실에서도, 2007년부터 10년간 작업실이 있던 제주 서귀포시 서광동리에서도, 여덟 번이나 다녀왔다는 고비사막에서도 자연을 눈에 담아 화폭에 옮겨왔다. 그의 ‘북원’, ‘중정’, ‘방문’ 시리즈는 투렌의 정원과 땅에서 시작됐다. 제주에서는 작업실에서 보이는 한라산과 송악산, 산방산, 작업실과 가까운 소나무밭이나 매화, 엉겅퀴와 산초나무 가지, 황우치 해안, 안덕 계곡과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여럿 볼 수 있다. 때로는 이웃집의 풍경이 그림에 담긴다.

사실적인 풍경화보다는 추상화에 가깝다. 가까이서 보면 꾹 눌리거나 흐트러지고 흘러내린 유화 물감이 눈에 띄지만, 몇 발 멀리서 보면 자연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작은 캔버스로 나눠 작업한 뒤 합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큰 캔버스에서의 작업을 고집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광대한 자연을 화폭에 담으려다보니 큰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전시장 입구 밖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가로 462㎝, 세로 528㎝ ‘북원’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가져 온 물감을 다 써버리고 싶다’는 작가의 생각, 프랑스에서 손수 풀을 뽑고 자갈과 식물 뿌리를 다듬으며 땅을 만지는 과정과 함께 2002~2010년에 걸쳐 완성됐다. 투렌의 풍경을 담은 또 다른 작품 ‘중정’은 2017년부터 그리기 시작하다 코로나19로 국내에 머물던 중 작업이 멈췄다가 지난해에야 작업이 끝났다.
전시 막바지에는 사뭇 다른 초기작도 만날 수 있다. 1975년 작품인 ‘개발도상국 “교수형”’은 강 작가가 프랑스로 이주한 후 인민혁명당 사건을 접한 뒤 그렸다. 배경을 이루는 파란 건물들과 공장 풍경의 한 가운데 붉은 기둥과, 어딘가에 매달린 듯 축 늘어진 신체가 그려졌다. 1989년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상자가 대거 발생한 광주 전남도청을 찾아 회색빛 물감으로 ‘전남도청’을 그려내기도 했다.

강 작가는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 소식을 접하고 프랑스와 제주에서 ‘시리아’ 시리즈를 그리기도 했다. ‘시리아’ 시리즈의 형식은 초기 작품보다는 최근작에 가깝지만,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상기하면 자연을 탐미한 작가의 다른 작품과 어색하지만은 않다.
서울시립미술관은 한국 여성 작가를 발굴·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남서울미술관에서 연 김윤신 개인전에 이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는 오는 6월8일까지.

'문화는 이렇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월30일]미술이 넘쳐흐른 홍콩…바스키아의 ‘토요일 밤’ 180억원에 낙찰 (0) | 2025.04.06 |
|---|---|
| [3월30일]영남 산불에 불탄 국가유산 30건… 잦아지는 산불 피해 막으려면 (0) | 2025.04.06 |
| [3월26일]천년고찰 고운사의 보물 등 국가유산 3건 전소…보물 10건 자리 옮겨 (1) | 2025.03.29 |
| [3월26일]조계종 총무원장 “문화유산 보호 중요하지만, 생명이 가장 우선” (1) | 2025.03.29 |
| [3월26일]신학대학 안 나온 전광훈, 어떻게 극우 기독교 행동대장 됐나 (0) | 202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