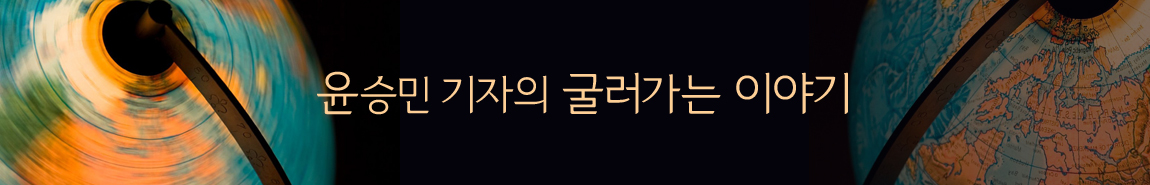금빛 머리띠에서 뻗어 나온 세 가닥의 나뭇가지. 현존하는 신라 금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그 때문에 여러 곳에서 신라 금관을 보면 천년 넘게 이어 온 금빛에 압도되다가도, 각자 개성이 있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개관 80주년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28일부터 여는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은 그동안 몰랐던 신라 금관의 참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일제강점기이던 1921년 처음 발견된 이래 현존했던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전시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라의 유물이었는지 수년간 논란이 일었던 교동 금관을 뺀 나머지 5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황남대총 북분·금관총·천마총 금관)나 보물(서봉총·금령총 금관)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금관과 함께 출토된 허리띠 등 전시 유물 총 20건 중 국보와 보물은 각각 7건에 이른다.

27일 찾은 전시장의 문을 연 것은 6점의 금관 중 형태가 가장 단조로운 교동 금관이다. 금빛 머리띠에 나뭇가지 모양 세움 장식 3개가 전부다. 다른 신라 금관에 있는 뒤통수 쪽의 사슴뿔 모양 세움 장식 2개나 치렁치렁 매달린 드리개는 없다. 세움 장식의 곁가지도 1단뿐인 데다 크기도 작지만, 교동 금관은 현존 6점의 신라 금관 중 가장 이른 5세기 전반에 만들어져 금관의 표준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나뭇가지는 삼한 시대 큰 나무를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소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동 금관 주위로 상영되는 영상은 그 기원을 담아 금관의 의미를 함께 알리고 있다.
이어 금관총 금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서봉총 금관, 왼쪽에는 금령총 금관이 함께 발견된 금 허리띠와 함께 전시돼 있다. 금관총 금관은 남성인 이사지왕, 서봉총 금관은 소지왕의 부인,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금령총 금관은 미성년 왕족의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 최고위 왕족들이 자신의 권력과 위신을 장신구로 어떻게 표현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다. 금관총 금관은 머리띠 위아래에 찍힌 점들이 물결무늬를 이루고 있고, 서봉총 금관은 머리띠와 세움 장식 사이에 모자 형태 장식이 있는 등 비슷한 형태 속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지녔다.

가장 아름다운 금관으로 불리는 건 머리띠 좌우에 매달린 드리개가 세 쌍에 이르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이다. 이는 황남대총 남분에서 발굴된 고깔 모양의 모관과 마주보고 있다. 일제는 모관이 금관의 구성품이라고 연구했으나, 해방 후 국내 학계는 모관은 일상에서, 금관은 제례에서 쓰이는 별개의 모자라는 연구 결과를 냈다. 신라의 찬란한 금관은 일제에 의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금관의 가치를 정확히 정의한 것은 한국의 연구성과라는 점이 흥미롭다.
금관을 고해상도로 촬영해 관람객이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금관들을 세밀하게 살핀 뒤 다시 금관 실물을 본다면 전시를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2월14일까지.

금관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뿜는 현대미술 작품들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만날 수 있다. 경주솔거미술관에서 지난 22일 개막한 한국미술 특별전 ‘신라한향’에서는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산 박대성의 대형 그림과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높이 5m에 이르는 신작 ‘반가사유상’(2025)은 먹과 전통 안료로 경북대 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상’을 그린 것이다. 실제 석조반가상은 하반신만 남아 있으나, 박대성은 상상력을 발휘해 상반신까지 그려냈다. 석조반가상의 뒤에는 판화로 찍은 듯한 판본체가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찍혀 있다. 글과 그림의 뿌리가 같다는 일념으로 각골문자부터 한글까지 연습해 온 박대성이 판본체를 그린 뒤 주변을 검게 칠해 표현한 것이다.
박대성의 ‘코리아 판타지’(2023)는 높이 5m, 폭 15m에 달하는 종이에 먹으로 한라부터 백두까지, 훈민정음부터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 울산 반구대 암각화까지를 담았다. 그림의 크기뿐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 상징적인 장소를 세밀하게 한 표현한 점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문화재 및 회화 복원 전문가이기도 한 김민은 어두운 전시실에 석굴암 본존불, 석가탑과 다보탑, 해와 달을 검은 배경에 그려 넣었다. 전통 한지에 전기석이라는 검은 광물을 갈아 배경색으로 사용했다. 영원을 상징하는 금빛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앞에 놓인 큰 물그릇에도 비쳐 고즈넉한 느낌을 자아낸다.

승려이자 예술가인 송천 스님은 지난해 부산비엔날레 출품작인 ‘관음과 마리아-진리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를 리뉴얼해 선보였다. 파란 옷의 성모 마리아, 붉은 옷의 관세음보살이 마주 보는 구도의 4m 높이 그림은 종교를 초월한 진리를 상징한 것이다. 박선민의 유리공예 설치작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과거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전시는 내년 4월26일까지.
우양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의 백남준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전시 ‘백남준 : Humanity in the Circuits’가 열리고 있다. 백남준 예술의 전환기라 일컬어지는 1980~1990년대 작품이 주를 이룬다. 다양한 매체가 회로처럼 얽혀 있는 그의 작품은 APEC 정상회의 슬로건의 ‘연결, 혁신, 번영’과도 맥이 통한다.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문화는 이렇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1월3일]‘장수 축하 잔치 그림’ 유일한 원본 담긴 화첩, 보물 지정 눈앞 (0) | 2025.11.05 |
|---|---|
| [10월28일]500만 와도 예산 부족…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전 단계 ‘사전 예약제’ 내년 도입 (0) | 2025.11.02 |
| [10월23일][책과 삶]중·러, 굳건한 듯 껄끄러운 우정의 역사 (1) | 2025.10.25 |
| [10월23일]수장고 속 왕실 유물과 무형유산 전승자의 만남 (0) | 2025.10.25 |
| [10월22일]신라 공주 무덤 ‘쪽샘 44호분’ 다시 짓는 과정 공개된다 (0) | 2025.10.25 |